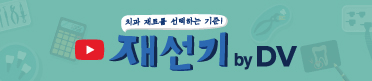질병이 과학적으로 인식되지 못했던 원시시대에는 질병은 악마나 악령들의 저주 때문에 생겨 인간의 능력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하며 다만 주술사나 마술사를 통해 어떤 의식을 통해 악령을 쫓고 화려한 춤으로 환자를 황홀하게 만들어 신비로움과 편안함을 주는 것으로 치유의 효과를 얻으려 했다.
마법과 신비로움이 의학적 치료의 본질이었다. 그 신비 속에는 저항할 수 없는 힘이 있었고 두려움마저 느끼게 하였으며 그때 의사의 역할은 권위가 있었고 초자연적인 존재와 연결되어 있는 듯한 경외심과 신비로움이 있었다.
지금 이 시대의 의사 역할은 환자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환자들을 질병에 대해 학생처럼 교육시키고 함께 치료과정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의사의 역할은 마치 치료사인 동시에 교사(敎師)가 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치료의 모형이라 생각하고 있다.
과학이 질병을 해결하는 열쇠가 되면서 환자들도 이론적으로 의료과학의 일부를 습득하게 되었고 어느 정도 의사가 질병을 치료하고 다스리는데 동조 내지 도움을 주는 책임마저도 갖게 된 것이다.
옛날에 있었던 의식과 신비 속에 있었던 진정한 열정과 위험을 초월하는 힘이 현대의학에서는 찾아 볼 수 없게 되었다. 대신 최첨단 기술로 포장된 화려한 장비들로 무장된 기술에 의해서 신비감을 부추기고 있긴 하지만 유용한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도 든다.
현대의학은 ‘믿음이라는 열린 마음’이 없이 의사와 환자의 관계를 유지하는 경향 때문에 많은 환자들이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니면서 각기 다른 의견을 듣기 위해서 의료 전달체계를 남용하는 경향을 낳게 되었다. 환자와의 불신 때문에 빚어지는 의료 분쟁의 문제가 허다하게 생기며 따라서 의료소송 같은 문제들이 더욱 많아지고 있다.
우리는 환자를 진심으로 돌봐야 한다. 또 진심으로 돌보고 있다는 것을 환자에게 언제나 느끼게 해야 한다. 왜냐하면 좋아하는 의사에게는 고소나 소송이나 분쟁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 의료의 질과 소송은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 소송이나 분쟁의 문제는 언제나 환자와 의사간의 불신과 노여움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환자와 의사간의 신뢰의 붕괴는 오래된 것이지만, 의사와 환자간의 격리감을 갖게 되는 원초적인 문제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의학교육의 본질에서부터 검토되어야 할 부분도 있다. 의과 대학에서 치과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경험이 해부학 실습이다. 청진기나 핸드피스를 잡기 전에 먼저 포르말린 냄새가 나는 시체실로 들어가게 된다.
의대생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고, 그들과 같아질 수 없는 것임을 깨우쳐 주는 첫 시도이다. 죽은 사람의 신체일부를 손에 들고, 현학적인 과학 토론을 하는 것을 먼저 배우게 된다. 시체는 질문도 하지 않고, 아플 때 소리치거나 눈물도 보이지 않는다. 앞으로 그들이 만나게 될 최초의 환자인 셈이다.
감정을 멀리 떨어뜨려 놓고 인체를 마치 고장 난 기계처럼 다룰 수 있는 냉정과 잔혹함마저 배우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의사들은 교육과정을 통해 점점 냉소적으로 바뀌어 간다. 예의를 지킬 시간도 없고, 환자나 의사 어느 쪽도 감정을 고려할 시간이 없게 되어 버리는 습성을 기르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 방법은 의사가 의료 최고급 기술자가 되는 것이며, 의사들은 자신과 환자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고, 그 벽은 과학과 침묵으로 가로막힌 벽이다. 환자들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도울 준비가 되어있는 의사로부터 간절하면서 열정이 담긴 진실한 대화나 판단을 듣고 싶어 한다.
환자들은 적어도 조금은 의사가 자신의 감정을 이해한다는 것을 보여주길 원한다. ‘환자를 동료처럼(patients as colleague) 생각하자.’

글: 최상묵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덴틴 발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