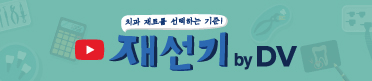매년 도루묵값이 금값이더니 일본 원전 사고 때문에 올해는 많이 내렸습니다. 게다가 풍어까지 겹쳐 어민들 시름이 이만저만이 아니랍니다. 올 겨울 술안주는 무조건 도루묵구이입니다.
날씨가 쌀쌀해지니 도루묵 생각이 간절해집니다.
예전엔 제철에 잡은 도루묵보다 사철 냉동한 놈들을 내놓는 곳이 많아서 살도 퍽퍽하고 특유의 감칠 맛도 적으며 알을 에워싸는 점액질도 있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크기도 좀 컸으면 좋으련만 기껏해야 양미리 정도 사이즈이니 씹는 맛도 기대난망이었죠.
하지만 도루묵 제철에 제법 큰 놈을 구어 먹다 보면, 뱃속 알의 크기도 이쿠라(연어알) 정도인데다 낫또의 그것처럼 점액질 범벅이라 묘한 맛을 냅니다. 하나하나 씹히는 알의 질감 역시 매우 독특합니다.
알려진 도루묵 요리로는 찜, 찌개 등도 있지만 뭐니 뭐니 해도 전어처럼 구워 먹어야 제맛입니다.
일단, 웰던(well-done) 수준으로 도루묵을 구운 뒤에 꼬리와 머리를 양손으로 잡고 머리부터 속의 뼈까지 남김없이 씹어 먹는 것이 정석입니다. (전어를 구워서 먹는 방법과 같다고 보면 됩니다.)
전설에 따르면, 고려시대의 어느 왕이 동해 쪽으로 몽진을 갔다가 이 생선을 맛있게 먹고는(피난길엔 허기가 반찬인지라...) 이름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여기서 시대가 고려가 아니라 조선시대의 선조라는 설도 있지만, 그가 피난간 곳은 의주 쪽이었지 동해안은 아니었지요. 여하튼 신하인지 누구인지가 대답하길 '묵'이라고 했다는데, 왕은 생선의 껍질색이 은색이므로 "앞으로 은어(銀魚)라 부르렸다~!"하며 이름을 하사했습니다. 환궁한 뒤에 다시 그 맛이 그리워 진상을 시켰더니, 강원도 관찰사가 그 생선이 평양까지 도착할 동안 썩지 않도록 갖은 방법으로 곱게 포장을 해서 올렸답니다.
하지만 왕은 이미 옛날의 피난길에 지치고 허기진 왕이 아닌 관계로 "맛 더럽게 없군! 생선 이름을 도로 '묵'이라 부르렸다~!"해서 '묵'이라는 생선은 '도로묵'이 되었고 약간의 음 변화를 거친 뒤에 '도루묵'이 되었다는 건 이미 잘 알려진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왕이 피난을 가서 먹었을 때가 도루묵이 제철인 겨울이었고, 환궁하여 다시 먹었을 때는 늦봄이나 여름이 아니었을까 하는 엉뚱한 생각도 해봅니다.
더하여 '말짱 도루묵'이라는 말도 '헛고생'을 뜻하는 말인데, 강원도 관리가 그렇게 정성들여 올려 보낸 일이 허사가 된 데서 연유한 것은 아닐런지요.
도루묵 알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생선알을 먹는 나라는 많습니다.
캐비어 중에도 벨루가, 세부르가 혹은 오쎄트라처럼 비싼 알을 찾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나라와 일본 사람들은 생선의 알을 젓갈로 담가 먹을 정도로 각종 알을 중요한 식량자원 겸 에너지원으로 사용했습니다. 사실 일본의 멘타이코(明太子, 명란젓)도 우리나라에서 건너간 것입니다.
영암의 김광자 할머니가 만드는 어란은 숭어알로 만드는데, 캐비어 값에 견줄 정도로 비싸고 귀합니다. 일본의 어란인 '가라스미'나 이탈리아의 '보타르가'도 우리나라의 그것과 비슷하긴 하지만 만드는 공력이나 그 맛은 견줄 바가 못 됩니다. .
도루묵처럼 알이 뱃속 대부분을 차지하는 어종은 제법 많습니다.
겨울이 제철인 양미리도 있고 젓갈을 담그는 까나리도 있는데, 사실 이들은 같은 놈들입니다. 까나리가 맞는 말이고 양미리는 동해안에서 까나리를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만 일반인들은 많이 헷갈립니다. 어린 까나리 치어를 서해에서 잡아 젓갈을 담그는 경우는 까나리 그리고 다 큰 까나리를 동해에서 잡으면 양미리라 부른다고 기억하면 이해가 쉽겠군요. 양미리도 산란기엔 살이 반, 알이 반인데, 알맛은 도루묵과는 사뭇 달라 굉장히 부드럽고 크리미한 맛이고 도루묵은 그야말로 '봉봉 오렌지'처럼 알알이 터지는 맛과 넉넉한 점액질이 일품입니다.
일식집에 가면 덤찬(쯔끼다시)으로 많이 나오는 열빙어(시샤모)도 몸체의 삼분의 이가 알덩어리인데, 일식집 언니가 간장에 찍어 굳이 입안에까지 넣어주는 것이 부담스럽긴 하지요. 시샤모 한마리가 결국은 배춧잎 한 장과 같은 말이니까요.
도루묵도 연어알처럼 어느 정도 알의 사이즈가 커야 알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알이 작은 놈들은 양념맛이나 간장맛에 먹는 것이지 결코 자체 알맛은 아닌 것입니다.
알은 다산(多産)을 의미하고 또 정력(精力)을 뜻하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알을 먹는 행위는 단순한 음식 섭취에 더하여 다분히 유감주술적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여하튼 단종(斷種) 상태와 진배 없는 나이에 알 요리를 많이 먹으면 여러모로 곤란해지겠지만, 혹 불의의 사고(?)가 나더라도 청문회까지 나갈 필요가 없는 스스로의 지위에 한결 위로가 됩니다.

스스로 알을 이기지 못해 배 밖으로 나왔군요.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저하고도 비슷합니다.

이태원의 '해천'에서 특별히 끓여준 도루묵찌개입니다. 칼칼하고 시원합니다.